
이번해는 겨울이 아주 따뜻할 것 같다. 왜냐면 글을 쓰는 11월 현재도 바람막이만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아주 따듯하기 때문이다. 이 즈음은 날씨가 더운 게 심상치 않군 하고 며칠이 지난 시점인 것으로 기억한다. 아 그리고 일기를 보니 심리검사 결과가 나온 직후였다. 이때 '내가 생각하는 나'와 '검사 결과로 나온 나'가 굉장한 차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심란한 했다. 전시는 이런 와중에 보러 가게 됐다.
(헉 그런데 글쓰기를 미루다가 올리는 지금은 또 날씨가 추워졌다.)
전시장은 인천에서 꽤 먼 곳에 있다. 어느 때와 비슷하게 지하철을 타고 역에서 전시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지도가 안내한 꺾어야 할 곳을 지나쳐 돌아 돌아 전시장에 도착했다. 전시장을 가면서도 더웠지만, 전시장 실내도 더웠다. 들어갈 땐 후덥지근 한 기운이 올라왔지만, 어른들의 말씀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이내 괜찮아졌다.



나무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전사 돼있었고 가끔 보이는 납땜을 한 것 같은 금속 모양, 그 주변으로 약간 그을린 흔적이 보여 흥미로웠다. 상처주기를 즐기는 사람 같다.
나는 가끔 타투를 할까 생각을 하곤 한다. 만약 하게된다면 잉크를 넣는 것이 아니라. 흉터로 정교하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타투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김나빈 작가의 모든 조형이 정교한 상처로 타투를 입힌 것 같았다. 아니면, 태닝을 해서 만든 정교한 탄 자국. 잉크가 스며들어 자연스러워진 게 아니라 피부자체가 만들어 낸 색 같다. 만든 모든 표면이 원래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ㅋㅋㅋㅋ 웃긴 점: 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같은 게 여기 있지? 근데 왜 어울리지?

그리고 나무랑 실리콘이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립글로스를 연상하게 했는데, 뭔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 풀이나 이런 거 먹는 게 굉장한 일이어서 한 번씩 먹어보고 자랑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김나빈 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형이 뭔가 뭔가 이런 일탈, 유치하고 이상한 일탈의 상황을 감지하게 한다. 어렸을 때 딱풀 먹고 물풀 먹고 종이 먹고 자랑할 때 느끼는 감각.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는 생각으로 자랑하면서 하는 사소한 일탈 말이다.

이건 전시 후기 적으면서 발견한 건데(이 당시에도 발견해서 찍은 건데 지금 까먹은 것 일 수 도) 이 조그만 돌로 균형 잡기.. 나무에 동글동글 맺힌 납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조형미: 쾌감쾌감. 아 적다 보니 어떤 이미지를 전사하는지 궁금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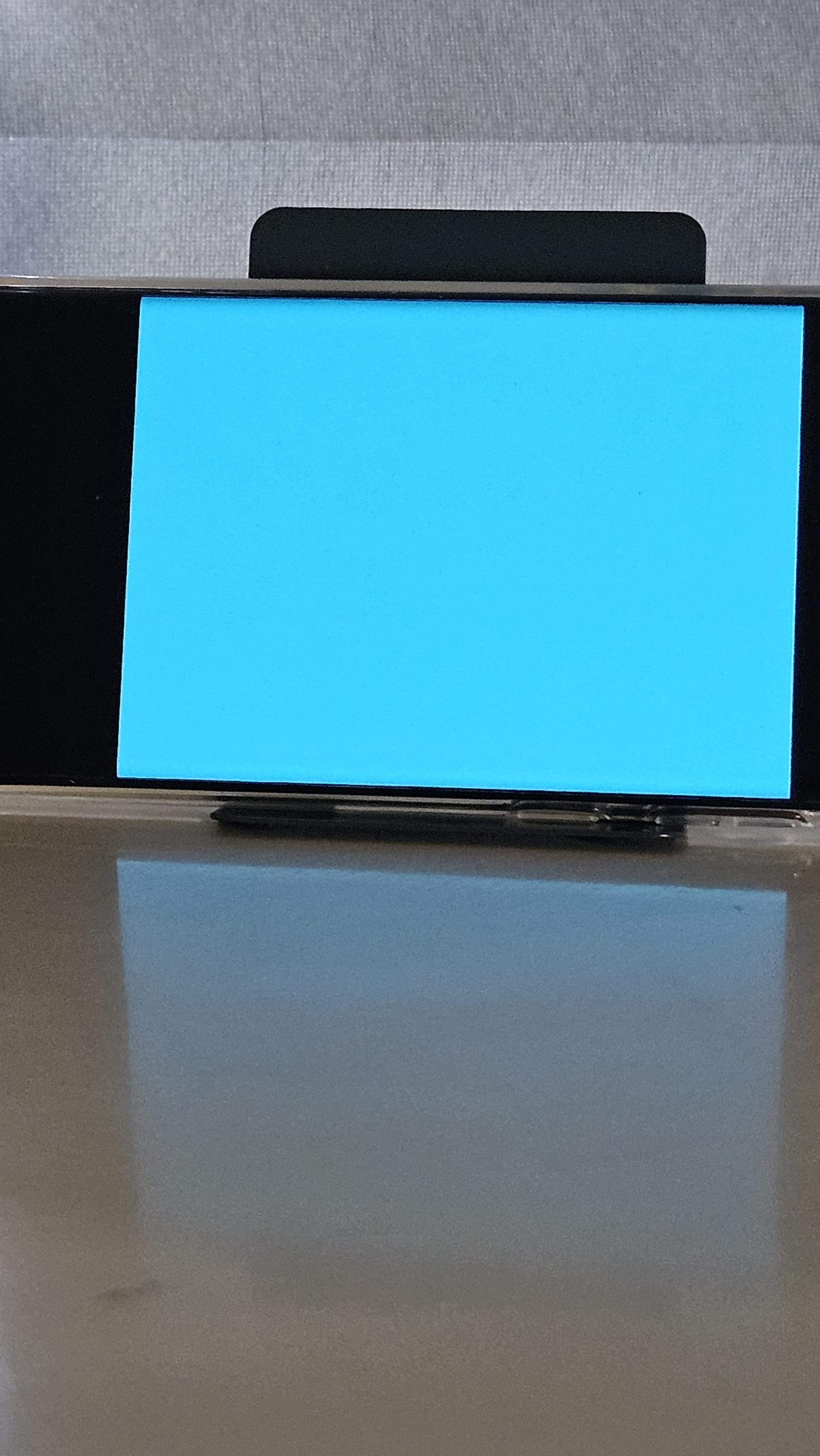





아시다시피 각각의 단어는 ‘휴가’와 ‘소명의식’을 뜻합니다. 두 단어는 한 글자 차이로 비슷한 소리를 내며 말해진다만 각각이 지닌 의미는 다소 대비되네요. 한편에선 임무를 잠시 미뤄두고 여유로움을 만끽한다면 다른 쪽에선 임무의 부름에 성실히 임합니다. 더하여, ‘소명’이라는 단어는 ‘하늘이 내린 일’이라는 맹목적인 뉘앙스와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물음표로 시작해 온점으로 마치는 탐구와 성찰의 의미, 이 둘을 담고 있어요. (···) 제가 보낸 이번 해의 여름은 저 두 단어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고 지독했던 더위와 작업실에서의 피서.
-운영자와의 편지 중
쉼표 온점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다. 아마 전시장 리플릿에 '시를 닮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다' 정도의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리플렛 찾으면 제대로 적어야지..) 그 글을 읽고 이 플로어맵을 보니까 더 감명 깊고 아주 좋았다. 리플릿에 디테일 살리면 이렇게 전시가 좋아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화가 좀 났다. 나는 왜 이런 디테일을 못 잡지? 질투 났다. 이게 좋은 이유는 작가가 원하는 구성을 가져가면서 전시장에 놓인 작업을 관람자만의 문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열린 지점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이런 여유를 만들어 낸 전시 구성 정말 부럽다.
이번 전시는 앞서 언급한대로 내가 좀 힘들 때 보러 갔다. 심리검사결과를 마주하고서 '나는 지금까지 무슨 판단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전시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 헛헛함. 무언가 허탈함. 어쩔 수 없이 평생 생길 가벼운 빈 곳. 작가는 그걸 참 따뜻하고 침착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바라보려 노력하는 것 같다.)
정말 좋았어서 많은 말을 적고 싶지만 작가와 헛헛함을 이야기하다 나온 "열심히 살아서 시원섭섭한 거야"로 마무리해야겠다.
시원 ~~~ 섭섭 지금은 춥다.
어릴적 우리 집 밥상머리 교육은 주로 아버지가 하셨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셨다. 아주 요리를 하신 건 아니고 계란프라이 같은 간단한 조리와 반찬을 내놓는 등의 일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자라셨다. 5남매 중 둘째로 첫째 큰아버지가 서울로 가 공부할 동안 아버지는 시골에서 할머니의 혀처럼 일하셨다.(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다.) 시골에서 자라셔서 그런지 약간 새마을 운동에 나올 것 같은 교육을 하셨다. 기억나는 건 아버지가 오시면 "충성 역군 아버지 회사 잘 다녀오셨습니까!"라는 인사를 했던 것이다. 역군(役軍)이 정말 새마을 운동 느낌이 나지 않는가. 그렇다고 아버지는 아주 권위적이거나 나와 동생을 몰아붙이진 않았다. 따듯하게 많은 걸 챙겨 주셨지만, 특정한 부분에선 이런 규칙을 지켜야 했다.
아버지의 이러한 교육은 밥상에서도 이어졌다. 아버지는 콩밥을 고봉으로 퍼주곤 "농부들이 피땀 흘려 만든 것이니 다 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밥과 반찬이 애매하게 남을 때면 "책임량"이라고 말하고 나눠주셨다. 나는 너무 배부르지만 한입에 욱여넣고 자리를 일어섰다.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지켜야 할 것이었고 나는 아버지가 ♥ ♥ ♥ ♥ 때문에 지켰다. 그렇다고 목구멍까지 처넣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더먹으라고 주는, 시골 어르신 같은 넉살을 아주 싫어한다. 예전엔 그냥 짜증 나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싫어한다. 동시에 먹을 게 애매하게 남는 것도 싫어한다. 남들과 같이 피자를 먹을 때 피자 자투리를 남기면 웬만하면 먹어치운다. 아버지에게 수여받은 일종의 의무감인가 싶다. 싫어하지만 동시에 안 지키면 마음에 걸리는 이상한 것.
(11/26) 찾았다 리플렛. " 사실 시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 다만 텍스트를 세련하는 일은 언제나 동경을 품었어요. 그러한 면모가 가장 두드러지는 장르가 시라고 생각했고요." 세련하는 일. 위에 언급한 여유는 "단어와 조사, 공백의 부호, 기호"를 선별해 공간으로 내놓아 생긴것이라고 생각한다.
IMF운영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적힌 글은 쉽고 편하게 와닿았다.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본 전시였기를 소망한다.
'전시 관람 > 24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칼리코 Calico> 최은영_ 갤러리 소소 (24.10.11-10.31) (1) | 2024.11.26 |
|---|---|
| <the very middle> 박은진, 신동민, 송지유 _상히읗(24.10.02-10.19) (1) | 2024.11.26 |
| <세 개의 축> 한승엽,Sun Park, gxu_ 공간 운솔(24.09.14 ~10.5) (2) | 2024.11.15 |
| <무늬, 주름으로 만든 기원> 거니림, 손희민, 송지현, 어밍워크숍 동이화_임시공간(24.09.21-10.04) (1) | 2024.11.15 |
| <캡션 되기 Closed captioning> 구나혜 _ 광명역 인근 (2024) (5) | 2024.11.15 |



